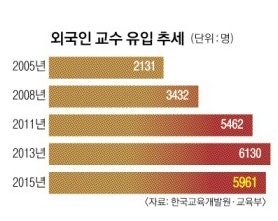미국 대중과학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기존 수상자들의 발언 등을 참고해 1901년부터 수여되기 시작한 노벨상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 12가지를 다음과 같이 추렸다.
1. 정제된 소감 : 수상자들은 연말에 진행되는 노벨 시상식과 만찬에서 즉흥적으로 소감을 밝힐 수 없다. 2013년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랜디 셰크먼은 자신의 소감을 스웨덴어로 번역하기 24시간 전에 노벨재단에 미리 제출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2. 옥중 수상 : 감옥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들은 사람은 지금껏 3명이 있었고, 모두 평화상을 수상했다. 독일의 평화운동가이자 작가인 카를 폰 오시츠키(1935년 수상), 미얀마의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1991년 수상), 중국의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2010년 수상)가 그 주인공들이다.
3. 노벨상 메달의 가치는? : 198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물리학자 레온 레더만은 올 초 요양비를 마련하기 위해 메달을 경매에 내놨다. 경매업체 측은 경매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76만5000달러(약 9억원)에 팔렸다고만 밝혔다. 노벨상 수상자 생존시에 팔린 노벨상 메달은 이를 포함해 모두 3개다.
4. 팔렸다가 다시 돌아온 메달 : 러시아 재벌 알리셰르 우스마노프는 지난해 제임스 왓슨의 1962년 노벨생리의학상 메달을 475만달러(약 53억원)에 샀다가 되돌려줬다. 우스마노프는 “업적을 기리는 상은 원래 주인에게 있어야 한다”면서 자신이 낸 돈이 연구자금으로 쓰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암으로 부친을 잃은 우스마노프는 암 치료 연구에 밑거름을 제공한 왓슨을 도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 성가신 보안 검색 : 201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브라이언 슈미트는 노벨상 메달을 갖고 비행기를 탔다가 곤경에 처한 적이 있다. 할머니를 뵙기 위해 미국 네브래스카주 파고에 도착했는데, 그의 소지품 중에서 수상한 물건을 발견한 검색요원이 그를 막아선 것. “가방 안 박스에 든 게 뭡니까?” “큰 금메달이에요.” 결국 슈미트는 박스를 열어 메달을 보여줬다. “뭘로 만들어진 겁니까?” “금입니다.” “어디서 난 거죠?” “스웨덴 국왕한테 받았습니다.” “왜 스웨덴 국왕이 당신한테 이걸 줬나요?” “우주의 팽창 가속도를 발견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이죠.” 대화가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슈미트는 이 메달이 노벨상임을 설명하고 나서야 검색대를 벗어날 수 있었다. 슈미트는 “노벨상을 어디론가 갖고 가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다. 적어도 파고에 도착해 엑스레이 머신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랬다”고 말했다.
6. 수상자들은 ‘한물 갔다’? : 노벨상 수상자 평균 나이는 59세다. 2007년 노벨경제학상(엄밀히 따지면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은행 경제학상’이다)을 받은 레오니드 후르비츠가 당시 90세로 역대 최고령 수상자였다. 지난해 17세 나이로 평화상을 받은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최연소 수상자다.
7. 내 돈은 어디 있소? : 아돌프 히틀러 전 독일 총통은 1937년 모든 독일인의 노벨상 수상을 금지했다. 반체제 평화운동가인 카를 폰 오시츠키가 평화상을 수상한 것에 격노해서다. 이 때문에 리하르트 쿤(1938년 화학상), 아돌프 부테난트(1939년 화학상), 게르하르트 도마크(1939년 생리의학상) 3명은 수상자로 선정이 되고도 상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 상과 메달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상금은 주어지지 않았다.
8. 시작은 험난했다 : 1895년 11월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은 자신의 마지막 유언장에 서명했다. 자신이 죽은 뒤에 재산 대부분을 노벨상 제정·유지에 쓰라는 내용이었다. 노벨은 1년 뒤 죽었으나 유언은 즉각 집행되지 못했다. 우선 유족들이 반대했고, 스웨덴 내부에서는 ‘국적에 관계 없이 최고의 공로자에게 상을 주는 것은 국부 유출’이라는 논란이 벌어졌다. 노벨이 지명한 수상 위원회도 그의 유지를 따르기를 거부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뒤인 1901년에서야 노벨상 시상이 시작됐다.
9. 두 번째는 달라요 : ‘트랜지스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물리학자 존 바딘은 1956년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으나, 가족을 고향에 남겨둔 채 시상식에 홀로 참석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영상 에디터에 따르면 그는 아들들에게 “학교 빼먹지 말고 시험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말을 남기고 스웨덴으로 향했다고 한다. 이를 알게 된 스웨덴 국왕은 시상식에서 바딘을 크게 나무랐다. 바딘은 “다음 번에는 꼭 가족을 데려오겠습니다”라고 약속해야만 했다. 허언처럼 여겨졌던 이 말은 나중에 현실이 됐다. 바딘이 1972년 또다시 노벨상을 받게 되면서 역사상 세 번째로 노벨상을 두 번 수상한 사람이 된 것. 바딘은 두 번째 시상식 때는 가족을 모두 데려왔다고 한다.
10. 사후 수상 : 노벨재단은 1970년 ‘죽은 이에게는 상을 수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결정했다. 그 전에는 상이 추서된 경우가 두 번 있었다. 하지만 노벨위원회는 2011년 랠프 스타인먼을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결정한 이후에야 그가 숨진 사실을 알게 됐다. 그가 발표 사흘 전에 사망한 것이다. 위원회는 고심 끝에 수상 결정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11. 업적과 수상 사이 :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을 만한 공로를 세운 시점과 실제 상을 수상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다.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0년에서 30년 정도 차이가 난다. 1910년대 초반 종양 유발 바이러스를 발견한 페이튼 라이스는 50년여가 지난 뒤에야 그 업적을 인정받아 1966년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반면에 양천닝과 리정다오는 1956년 패리티법칙에 관한 연구 업적을 세운지 1년 만인 1957년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12. 자기 홍보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 지금껏 152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기고를 한 적이 있다. 이들이 이 잡지에 쓴 글은 모두 246건에 달한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