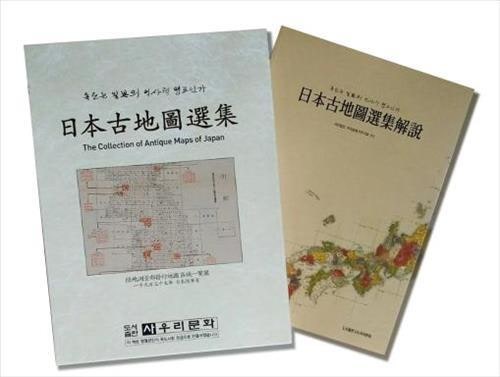9월 4일 ‘간도의 날’…대한제국 뜻과 상관없이 뺏겨
淸ㆍ日간 1909년 간도협약 잊지말자는 의미로 제정
韓ㆍ中간 외교 문제 비화 우려…관련 교육도 최소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잃어 버린 뒤 이어진 국권 피탈의 위기 속에서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역사에서 떨어져 나가고 만 땅이 있다. 그곳이 바로 간도(間島)다.
4일은 제11회 ‘간도의 날’이다. 이날은 1909년 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간도협약에 의해 대한제국과 청의 국경을 당사국인 대한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획정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제정됐다.
을사늑약으로 인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체결된 간도협약에는 청ㆍ일 간 뒷거래가 숨어 있다. 만주 진출을 원했던 일본은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청에 간도 땅을 넘기고 말았다.
국내에선 간도라는 명칭과 위치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를 가리키는 ‘서간도’와 두만강 북부의 연길, 혼춘, 왕청, 화룡 등 만주 땅을 가리키는 ‘동간도(북간도)’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간도라 함은 동간도를 의미한다.
 [사진=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전국 지도. 두만강 북쪽과 토문강 사이의 간도 지역 일부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표시돼 있어 간도 영유권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짐작할 수 있다.]
[사진=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전국 지도. 두만강 북쪽과 토문강 사이의 간도 지역 일부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표시돼 있어 간도 영유권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짐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간도라는 지명은 병자호란 뒤 청나라가 이 지역을 이주 금지의 무인 공간인 ‘봉금지역’으로 정하고 청ㆍ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허가하지 않는 공간으로 삼은 뒤 ‘섬과 같은 땅’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조선인 농민들이 해당 지역을 새로 개간했다는 뜻에서 ‘간도(墾島)’로 표기하기도 했다.
간도는 우리 역사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공간이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주요 생활 터전이 됐던 간도는 조선 후기 수많은 조선인들이 건너가 개간하며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조선과 청은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워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기도 했다.
 [사진= 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를 가리키는 ‘서간도’와 두만강 북부의 연길, 혼춘, 왕청, 화룡 등 만주 땅을 가리키는 ‘동간도(북간도)’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간도라 함은 동간도를 의미한다.]
[사진= 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를 가리키는 ‘서간도’와 두만강 북부의 연길, 혼춘, 왕청, 화룡 등 만주 땅을 가리키는 ‘동간도(북간도)’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간도라 함은 동간도를 의미한다.]
이후 제작된 각종 지도와 기록에도 간도가 조선의 영향력을 받던 지역임을 증명하는 많은 내용이 남아 있다. ‘조선정계비구역약도’, ‘백두산정계비도’, ‘로마 교황청의 조선말 조선지도(1924년 제작)’ 등 수많은 지도에는 동간도를 조선의 관할로 표기하고 있다. 또 대한제국은 1900년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ㆍ파견해 동간도를 행정적으로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편입시켰고, 세금을 징수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이애 대해 역사 강사인 A 씨는 “한ㆍ중 간 영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조선 후기부터 조선 조정이 나서 간도 지역까지 행정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과 더불어 이곳에서 살던 조선인 주민들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밑바탕을 구성했단 점 등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볼수만은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간도협약 이후 중국이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고 현재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1962년 비밀리에 중국과 체결한 조ㆍ중변계조약을 통해 북방 경계선을 두만강의 지류인 홍토수로 정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처럼 국제 정치적으로 어려운 현실과 함께 간도를 인식하려는 한국인들의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만으로 100년이었던 2009년에만 잠시 관심이 일었을 뿐, 이후에는 사실상 국회 등 사회 각계의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과 마찰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것도 아닌 데다 (한국이)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지 않는 만큼 정부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학생을 비롯한 시민에 대한 관련 교육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교과서에서도 역시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한민족의 해외 이주’ 등의 완곡한 표현으로 표기 방식이 바뀌기도 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淸ㆍ日간 1909년 간도협약 잊지말자는 의미로 제정
韓ㆍ中간 외교 문제 비화 우려…관련 교육도 최소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잃어 버린 뒤 이어진 국권 피탈의 위기 속에서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역사에서 떨어져 나가고 만 땅이 있다. 그곳이 바로 간도(間島)다.
4일은 제11회 ‘간도의 날’이다. 이날은 1909년 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간도협약에 의해 대한제국과 청의 국경을 당사국인 대한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획정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제정됐다.
을사늑약으로 인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체결된 간도협약에는 청ㆍ일 간 뒷거래가 숨어 있다. 만주 진출을 원했던 일본은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청에 간도 땅을 넘기고 말았다.
국내에선 간도라는 명칭과 위치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를 가리키는 ‘서간도’와 두만강 북부의 연길, 혼춘, 왕청, 화룡 등 만주 땅을 가리키는 ‘동간도(북간도)’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간도라 함은 동간도를 의미한다.
 [사진=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전국 지도. 두만강 북쪽과 토문강 사이의 간도 지역 일부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표시돼 있어 간도 영유권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짐작할 수 있다.]
[사진=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전국 지도. 두만강 북쪽과 토문강 사이의 간도 지역 일부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표시돼 있어 간도 영유권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짐작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간도라는 지명은 병자호란 뒤 청나라가 이 지역을 이주 금지의 무인 공간인 ‘봉금지역’으로 정하고 청ㆍ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허가하지 않는 공간으로 삼은 뒤 ‘섬과 같은 땅’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조선인 농민들이 해당 지역을 새로 개간했다는 뜻에서 ‘간도(墾島)’로 표기하기도 했다.
간도는 우리 역사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공간이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주요 생활 터전이 됐던 간도는 조선 후기 수많은 조선인들이 건너가 개간하며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조선과 청은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워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기도 했다.
 [사진= 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를 가리키는 ‘서간도’와 두만강 북부의 연길, 혼춘, 왕청, 화룡 등 만주 땅을 가리키는 ‘동간도(북간도)’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간도라 함은 동간도를 의미한다.]
[사진= 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를 가리키는 ‘서간도’와 두만강 북부의 연길, 혼춘, 왕청, 화룡 등 만주 땅을 가리키는 ‘동간도(북간도)’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간도라 함은 동간도를 의미한다.]이후 제작된 각종 지도와 기록에도 간도가 조선의 영향력을 받던 지역임을 증명하는 많은 내용이 남아 있다. ‘조선정계비구역약도’, ‘백두산정계비도’, ‘로마 교황청의 조선말 조선지도(1924년 제작)’ 등 수많은 지도에는 동간도를 조선의 관할로 표기하고 있다. 또 대한제국은 1900년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ㆍ파견해 동간도를 행정적으로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편입시켰고, 세금을 징수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이애 대해 역사 강사인 A 씨는 “한ㆍ중 간 영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조선 후기부터 조선 조정이 나서 간도 지역까지 행정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과 더불어 이곳에서 살던 조선인 주민들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밑바탕을 구성했단 점 등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볼수만은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간도협약 이후 중국이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고 현재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1962년 비밀리에 중국과 체결한 조ㆍ중변계조약을 통해 북방 경계선을 두만강의 지류인 홍토수로 정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처럼 국제 정치적으로 어려운 현실과 함께 간도를 인식하려는 한국인들의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만으로 100년이었던 2009년에만 잠시 관심이 일었을 뿐, 이후에는 사실상 국회 등 사회 각계의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과 마찰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것도 아닌 데다 (한국이)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지 않는 만큼 정부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학생을 비롯한 시민에 대한 관련 교육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교과서에서도 역시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한민족의 해외 이주’ 등의 완곡한 표현으로 표기 방식이 바뀌기도 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